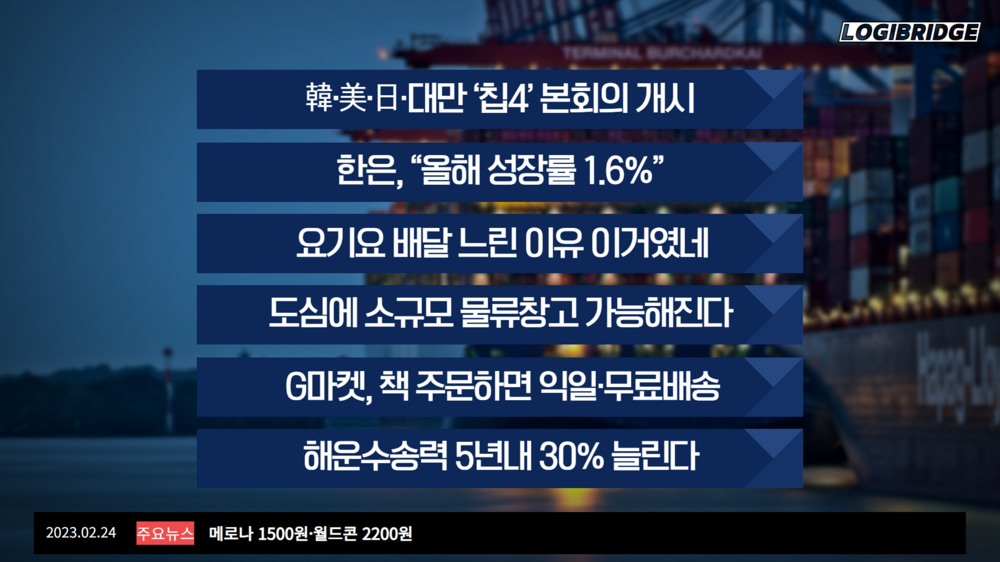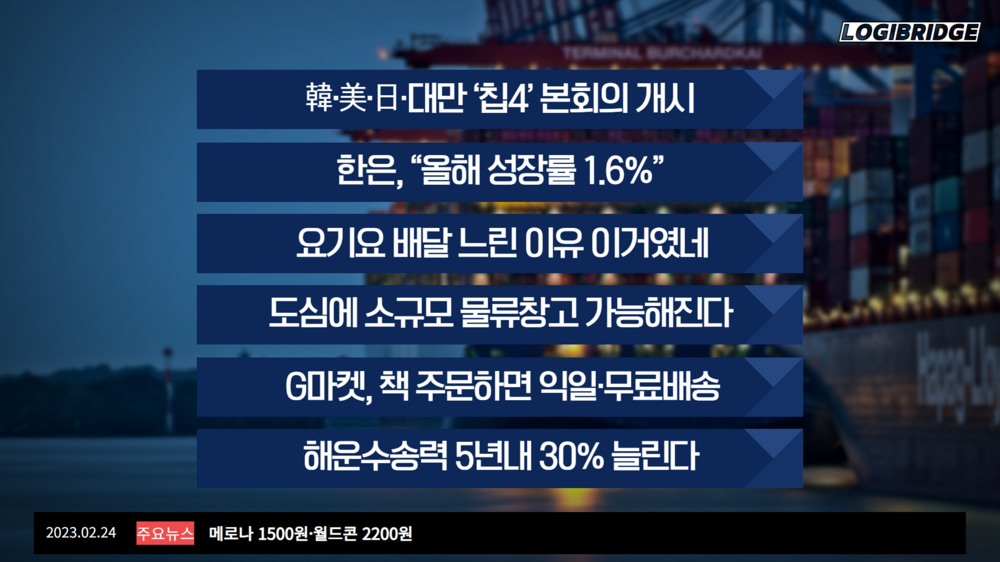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화두로 떠오르며 서비스 산업과 공급망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EU의 보복 가능성과 애플,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의 비용 폭등이 현실로 다가오며,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자충수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대체 경로와 비용 관리를 서둘러야 할 때예요. 이 사태가 글로벌 무역 체계의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드네요.
|
|
|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2일 발표되며 중국을 겨냥한 '전면 공격'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어요. 베트남(46%), 캄보디아(49%) 등 동남아 고율 관세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가 막혔고, 경제성장률이 1.3%포인트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5% 성장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무역 패턴을 뒤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
|
트럼프가 2일 반도체와 의약품을 관세 대상에서 뺀 건 미국 공급망 취약성을 먼저 챙긴 거로 보이네요. 첨단 칩이 없으면 빅테크가 흔들리고, 의료비 폭등은 서민에게 타격이 크다며 제외했죠. 그래도 업계는 안도보다 긴장감이 더 큰데, 산업별 관세가 따로 올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건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첫 신호일지도 몰라요.
|
|
|
트럼프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4월 4일 화제가 됐어요. 베트남(46%), 중국(34%) 같은 주요 생산기지가 타격을 입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죠. 로펌들은 물밑협상으로 관세 감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이 변화가 무역 패턴을 뒤흔들며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
|
머스크의 최신 설문에서 공급망 가시성과 다각화, 사물인터넷(IoT)이 물류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반면 AI는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에 머물렀죠.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은 가시성 강화에, 중동-아프리카는 AI와 IoT 도입에 앞장서지만, 각 지역마다 지정학적 문제와 인프라 격차가 발목을 잡아요. 이 설문은 물류 업계가 단순 기술 도입보다 실질적 가시성과 유연성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이네요.
|
|
|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 3일 화제가 되며 나이키, 아디다스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베트남(46%), 캄보디아(49%), 중국(34%) 등 주요 생산 거점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공급망 충격이 현실로 드러났죠. 주가 폭락(나이키 14.44%, 아디다스 11.72%)과 함께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나 경로 재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 혼란이 글로벌 브랜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할 만해요.
|
|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4월 3일 화두로 떠오르며 B2B 전자상거래와 제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10% 기본 관세에 중국(34%), 베트남(46%) 등 아시아 국가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애플·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 주가가 흔들렸죠.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공급망 재구성과 비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혼란이 시장의 새로운 판을 열 수도 있겠네요.
|
|
|
트럼프가 2일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어요. 알리, 테무, 쉬인은 미국 시장 대신 한국 진출을 가속화하며 알리(913만명), 테무(831만명) 사용자가 급증했죠. 하지만 유해물질 논란과 무역수지 적자 같은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요. 한국도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액 면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
|
|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발란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안이 커졌어요. 과거 캐시버닝으로 할인에 의존했던 시대가 끝나며, 자금 유입이 줄고 셀러 이탈까지 겹쳤죠. 이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흐름이 시장 재편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
|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환율 불안이 4월 3일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수입품 가격 상승과 신선식품 비용 증가를 걱정하며 관망 중이고, 중국 이커머스(알리·테무·쉬인)의 한국 진출이 경쟁을 더 뜨겁게 만들 거예요. 이 흐름이 한국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할지도 모르겠네요.
|
|
|
4월 1일 광저우-동관 간 드론 물류 항공이 첫 비행에 성공하며 화제가 됐어요. 10분 만에 50분 걸리던 육로 운송을 대체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혁신을 보여줬죠. 저고도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이 기술이 물류 속도와 효율성을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
|
|
신세계와 CJ가 1월부터 이마트 중간물류 배송을 CJ대한통운에 맡기며 협력을 강화했어요. 여주·대구·시화 물류센터에서 전국 155개 매장으로 상품을 옮기는 물량이 이커머스보다 훨씬 커졌죠.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시너지가 기대되며, SSG닷컴 물류센터 매각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이 동맹이 유통 시장의 판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지네요.
|
|
|
트럼프가 2일 '해방의 날' 행사에서 차량과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요. 즉시 발효된 차량 관세와 5월 3일부터 적용되는 부품 관세로, 업계는 미국 내 생산(넥스트쇼어링)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전문가들은 비용 상승과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이 늦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 변화가 무역 지형을 새롭게 그릴 가능성이 보이네요.
|
|
|
2월 물류센터 거래가 464건, 거래액 1조75억원으로 전월 대비 34%와 65% 급등하며 화제가 됐어요. 수도권, 특히 경기(124건)와 인천(27건)이 거래량 회복을 이끌며 지방도 경북(56건) 등 대부분 증가했죠. 금리 인하와 공급 감소로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난 모양인데, 이 흐름이 지속될지 주목되네요.
|
|
|
트럼프의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이 3일 화두로 떠오르며 한국 물류에 기회가 될 거란 목소리가 커졌어요. 중국 해운 공백을 채우고, 메가 포워더 육성으로 글로벌 톱50(현재 한국 2곳) 진입을 노리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죠. 미국 항만 터미널 확보와 M&A로 경쟁력을 키운다면, 이 변화가 한국 물류의 도약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
|
|
3일 로스앤젤레스 항만 CEO 세로카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또 한 번의 물동량 급등락이 올 거라 전망했어요. 과거처럼 관세 전 화물 선적(프론트로딩)이 급증 후 큰 하락이 예상되며, 항만 운영에 부담이 커질 듯하죠. 이는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물류 전략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항만 업계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버텨낼지 주목할 만해요.
|
|
|
완하이 라인이 4월 3일 인도-베트남 간 무역 확대를 겨냥해 새로운 아시아 내 항로를 런칭했어요. 호치민의 캇라이 항과 첸나이를 연결하는 TTX 서비스는 2200TEU급 선박 4척으로 28일 순환 운항을 시작하죠. 이건 지역 공급망 변화에 발맞춘 전략으로, 동남아와 인도 간 물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이 루트가 아시아 무역의 새로운 동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
|
|
예멘 후티가 3일 30회 이상의 美 공습으로 통신탑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긴장이 고조됐어요. 이에 응수해 USS 해리 트루먼 항모를 공격했고, MQ-9 드론 격추도 주장했죠. 전문가들은 후티의 도발이 무역로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이 혼란 속에서 해운 업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
|
|
트럼프가 2일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항공 화물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화물 수요 감소와 환율 상승(1470원대, 1500원 전망)으로 항공사 외화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죠. 발틱운임지수 21.8% 하락 속 1분기 실적도 암울한데, 이 여파가 제조업을 넘어 물류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
|
|
일본 최대 해운사 닛폰유센(NYK)이 4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화물 흐름이 둔화될 거라 경고했어요. 자동차와 소비재 가격 상승이 수요를 줄이며 물류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운임 상승 기회도 보이네요. 홍해 우회와 중국 리스크 속에서 파나마운하 우선 통과 복구를 요청하며 전략 조정에 나섰죠. 한국도 LNG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대체 항로 모색이 필요해 보이네요.
|
|
|
프랑스 CMA CGM가 4월 3일 에어 벨기에 화물사업 인수를 확정하며 화제가 됐어요. 벨기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화물기 4대와 사업 부문을 확보, 해운을 넘어 항공 물류까지 영역을 넓혔죠. 이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앞으로 더 큰 물류 혁신을 이끌지도 모르겠네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