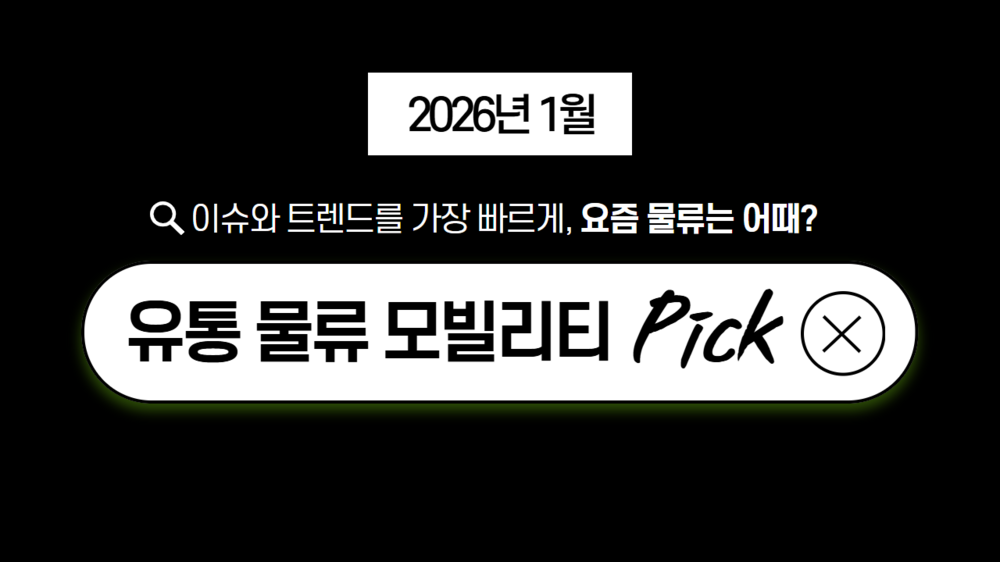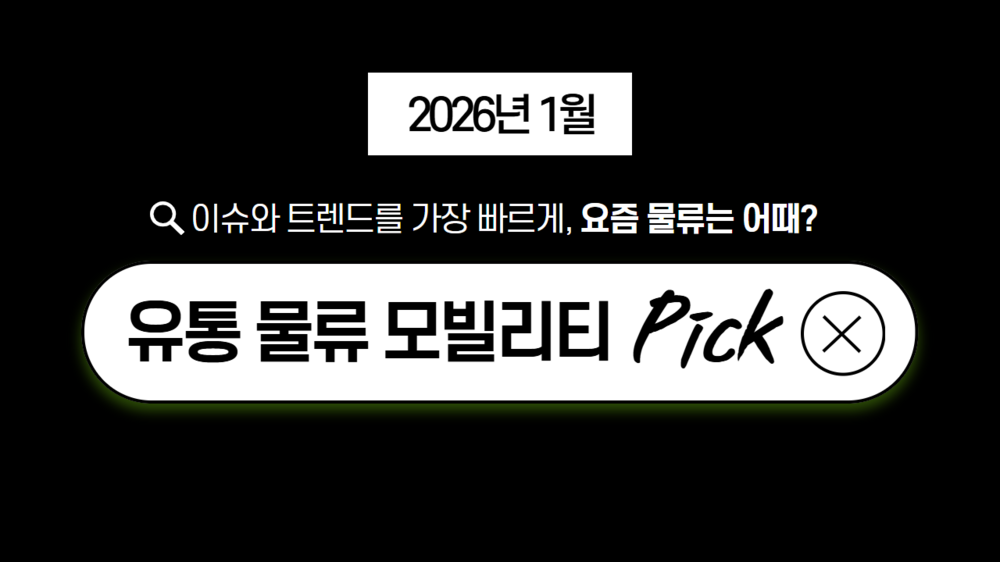2026년 주요 유통 기업들의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유사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바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유통·물류 업계가 겪어온 혼란과 정비의 시간이 이제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들은 그동안의 선택과 방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많은 기업들이 지난 시간을 ‘응축’이나 ‘내실을 다진 기간’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그룹은 CA협의체 체제 이후를 ‘응축의 시간’으로 회고했고, 신세계그룹 역시 최근의 결단을 ‘치밀한 준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단기간의 외형 확장보다는 뼈를 깎는 구조 정비에 무게를 둬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에 보여줄 뚜렷한 ‘한 방’이 아직 없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2026년은 그 응축된 에너지를 ‘성장’으로 연결해야 하는 해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 시장 점유율로 그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한 이상, 시장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매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신년사들에서 유독 반복된 단어는 ‘실행’과 ‘속도’입니다. 농심의 ‘Global Agility’, 현대백화점의 ‘기민한 실행 체계’, 신세계의 ‘한 박자 빠른 실행’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책상 위의 정교한 전략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담론이 기업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변화 신호를 얼마나 빨리 읽고 움직이느냐가 본원적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물 속에 뛰어들지 않고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정지선 회장의 말처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기보다 일단 저지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 대기업 조직 문화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AI는 도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동원그룹은 단순 업무를 AI에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영역에 집중하자고 했고, 카카오는 맥락을 이해하는 ‘에이전틱 AI’를 내세웠는데요.
주목할 점은 AI를 단순한 인건비 절감 수단이 아니라, 조직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에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현장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창과 방패를 모두 준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히려 ‘정직’과 ‘진심’을 강조한 오뚜기와 농심의 메시지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함영준 회장이 언급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표현은 식품 기업의 본질을 다시 상기시키는데요.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신뢰와 제품력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본질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NS홈쇼핑이 언급한 “성장 경쟁을 넘어선 생존 경쟁”이라는 표현은 유통업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이것저것 다 잘하려는 백화점식 전략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확실한 위치를 구축하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이랜드가 사업부를 쪼개고, 롯데가 체질 개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번 신년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화려한 선언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실행에 대한 집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2026년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해라기보다, 이미 던진 승부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냉혹한 ‘평가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