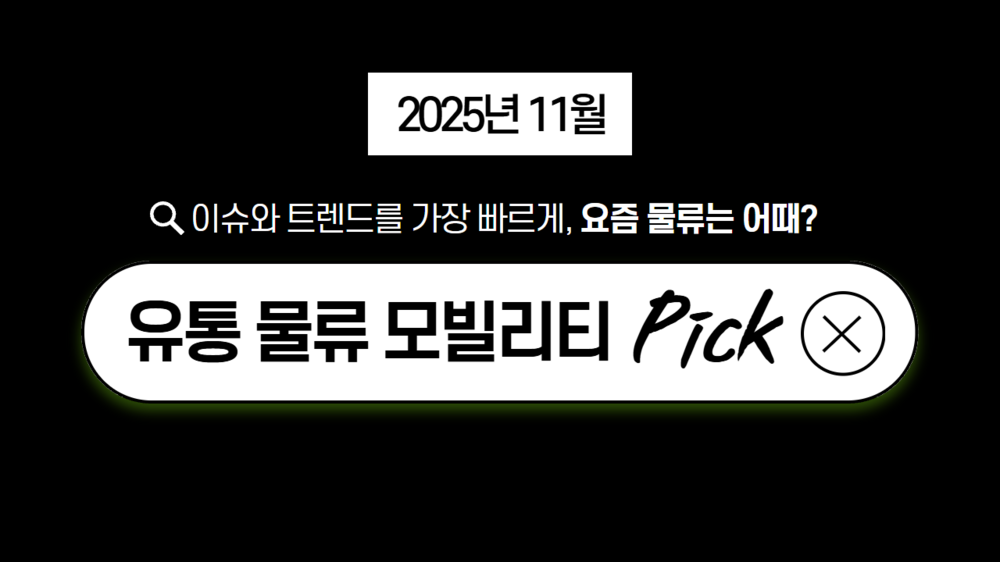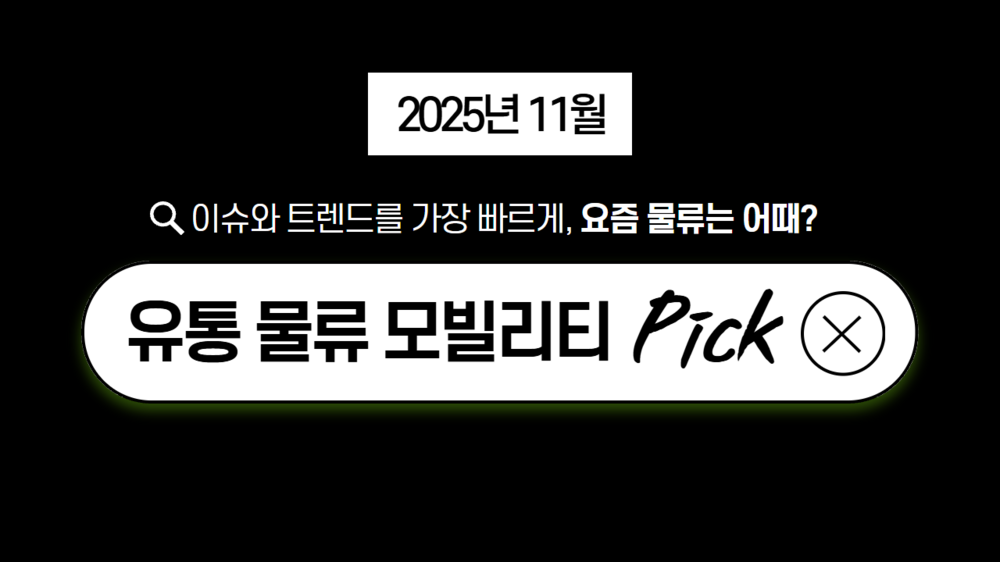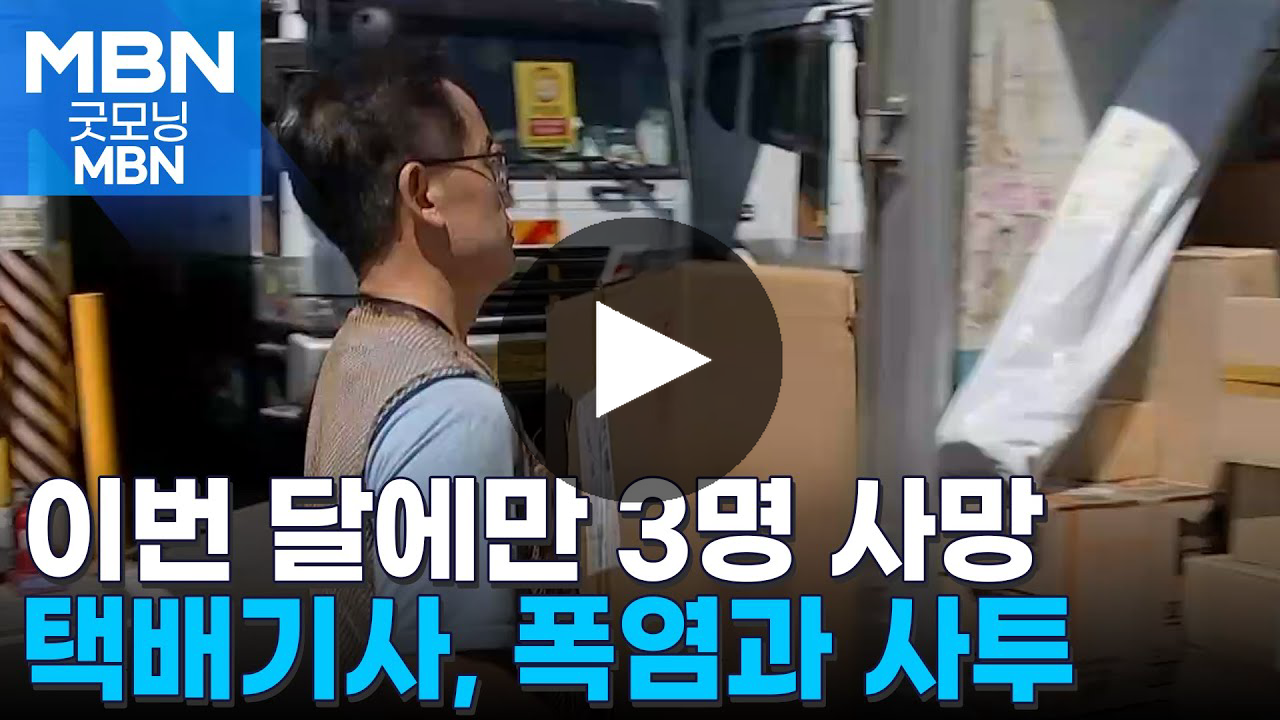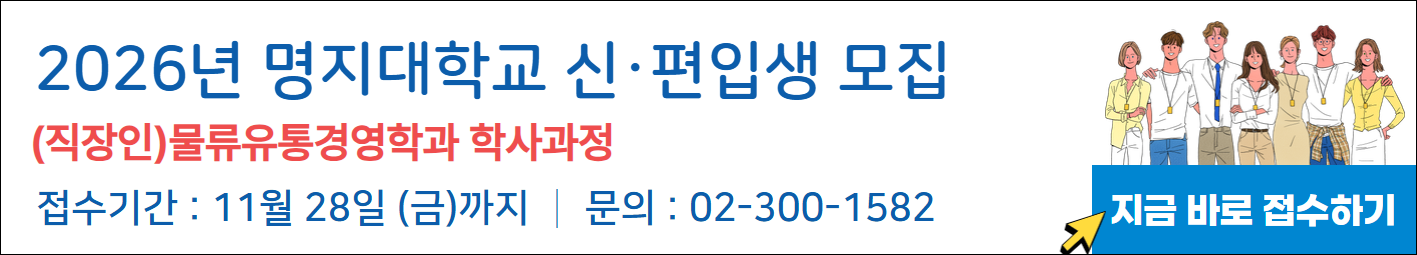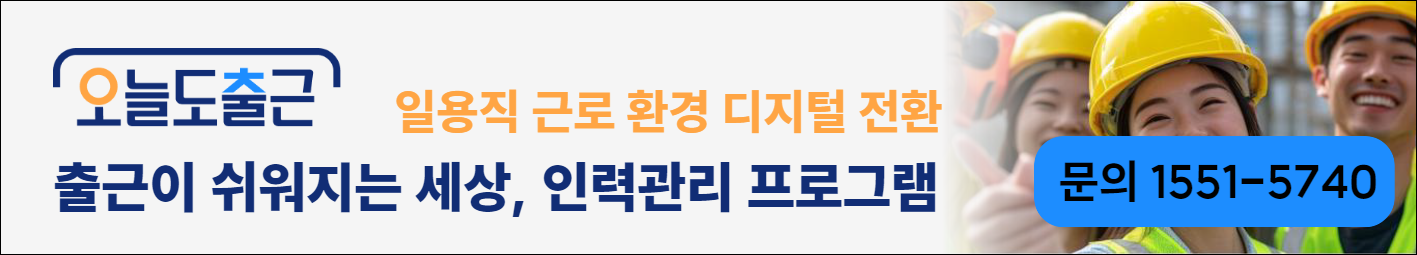|
올해 여름 전국은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폭염에 내몰렸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뒤섞이면 체감온도는 금세 50도에 육박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택배·배달 노동자에게 낮 시간대 근무를 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낮의 폭염과 자외선이 더 위험할까, 새벽의 심야노동이 더 위험할까. 이 논쟁은 단순한 ‘시간대 선택’이 아니라 노동의 본질과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묻는 질문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실내외 온도 차로 심장이 급격히 부담을 받고, 땀으로 젖은 옷은 움직임을 더디게 만든다. 반면 심야노동은 졸음, 교통사고, 생체리듬 붕괴라는 또 다른 위험을 품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단정은 어렵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논쟁의 중심에는 ‘편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편리함을 지탱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라스트마일 플랫폼의 속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낮엔 뜨거운 열기에, 밤엔 졸음과 위험에’ 동시에 내몰렸다. 건당 수수료 구조는 기사들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건수를 처리하도록 압박한다. 신호를 넘고, 인도를 질주하고, 더 많은 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위험이다.
하지만 지금의 초심야배송 제한 논쟁을 보면, 논의의 시선은 늘 한쪽으로 쏠린다. 기업은 소비자의 편의를, 노동계는 야간 노동의 건강 문제를, 시민단체는 안전을 말한다. 어느 주장도 틀리지 않았지만 어느 주장만으로 답을 만들 수도 없다. 단순히 “심야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새벽배송은 시대적 서비스다”라는 이분법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중요한 건 ‘방향성’과 ‘속도 조절’이다.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에 안착시키느냐다. 지금의 배송 시스템이 한순간에 낮·주간 중심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기업·협력사·근로자 모두 조정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해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바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답일까. 하나는 초심야대·폭염시간대의 자동화 확대다. 이미 국내외 물류센터는 AMR, AGV, AS/RS 등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부담이 큰 시간대에 자동화로 대체한다면 노동자의 야간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하나는 공동물류, 즉 공동배송체계의 적극적 도입이다. 과거 우정사업본부가 토요배송 논쟁 때 논의했던 방식처럼,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일부를 공유하면 초심야 물량 부담이 줄어든다. 트럭 한 대당 실어나르는 물량이 늘어나면 효율성은 높아지고, 기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새벽·야간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일본 식품업계 ‘F라인’ 모델이 보여준 것처럼, 공동화는 비용 절감과 노동환경 개선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 심야배송 논쟁은 기업·노동계·소비자·정부 모두가 타협점을 찾아야만 풀린다. 어느 날 갑자기 금지하거나, 정반대로 속도를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식의 접근은 결국 또 다른 파열음을 만든다.
노동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기업에게 전환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조율자로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폭염의 낮도, 심야의 새벽도 어느 하나 안전하지 않다. 둘 중 무엇이 더 위험하냐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까지 노동자의 위험을 ‘필수 서비스의 숙명’으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배송 산업의 미래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성에서 완성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심야배송 제한 논의는 반가운 첫걸음이다. 이제 필요한 건 서로가 한 발씩 움직이는 지혜뿐이다.
|